н•ҙм–‘мӮ°м—… л¶Ғк·№н•ӯлЎң к°ңл°ңмқ„ мң„н•ң мӨҖ비лҠ”?
нҺҳмқҙм§Җ м •ліҙ

ліёл¬ё

В
В
В
В
л¶Ғк·№н•ӯлЎңмқҳ лҜёлһҳ м „л§қ
В В кё°нӣ„ліҖнҷ”м—җ л”°лҘё к·№м§Җ л№ҷк¶Ң(ж°·еңҲ) к°җмҶҢлЎң '30л…„кІҪ л¶Ғк·№н•ӯлЎң к°ңл°©мқҙ мҳҲмёЎлҗҳкі мһҲмңјл©°, мқҙм—җ л”°лқј мң лҹҪкіј м•„мӢңм•„лҘј мһҮлҠ” мөңлӢЁ н•ӯлЎңмқё л¶Ғк·№н•ӯлЎң к°ңл°ңмқҙ м җм°Ё к°ҖмӢңнҷ”лҗ кІғмңјлЎң м „л§қлҗңлӢӨ. лҳҗн•ң, м§ҖмҶҚлҗҳкі мһҲлҠ” мӨ‘лҸҷ м§Җм—ӯмқҳ нҷҚн•ҙ мң„кё°мҷҖ лҹ¬мӢңм•„-мҡ°нҒ¬лқјмқҙлӮҳ м „мҹҒ мў…м „ л…јмқҳ, лҜёкөӯ нҠёлҹјн”„ 2кё° н–үм •л¶Җмқҳ л¶Ғк·№ к°ңл°ң нҷ•лҢҖ м „лһө мҲҳлҰҪ л“ұмқҖ л¶Ғк·№н•ӯлЎңмқҳ нҷңм„ұнҷ”лҘј м•һлӢ№кё°лҠ” мӨ‘мҡ”н•ң лҸҷмқё(еӢ•еӣ )мқҙ лҗ кІғмңјлЎң м—…кі„лҠ” 분м„қн•ҳкі мһҲлӢӨ.В
В В лӢ№мҙҲ л§ҺмқҖ м „л¬ёк°ҖлҠ” мҡ°нҒ¬лқјмқҙлӮҳ м „мҹҒм—җ л”°лҘё лҜёкөӯкіј мң лҹҪм—°н•©(EU) л“ұ м„ңл°©мқҳ лҢҖлҹ¬(е°ҚйңІ) кІҪм ңм ңмһ¬лЎң л¶Ғк·№н•ӯлЎң кҙҖл Ё н”„лЎңм қнҠё к°ҖлҸҷмқҙ м§Җм—°лҗ кІғмңјлЎң мҳҲмёЎн•ҳмҳҖмңјлӮҳ, мӢӨм ңлЎңлҠ” л¶Ғк·№н•ӯлЎңмқҳ л¬јлҸҷлҹүмқҖ кҫёмӨҖн•ң мҰқк°Җ 추세лҘј ліҙмқҙкі мһҲлӢӨ. лҹ¬мӢңм•„мқҳ л¶Ғк·№н•ӯлЎң кҙҖлҰ¬лҘј м „лӢҙн•ҳлҠ” көӯмҳҒмӣҗмһҗл Ҙкё°м—…мқё RosatomзӨҫмқҳ 분м„қ кІ°кіјм—җ л”°лҘҙл©ҙ, '23л…„ кё°мӨҖ нҷ”л¬ј мҡҙмҶЎлҹүмқҖ лҢҖлһө 3,620л§Ң нҶӨмңјлЎң кё°мЎҙ лӘ©н‘ңліҙлӢӨ 25л§Ң нҶӨ мғҒнҡҢн•ҳлҠ” мҲҳмӨҖмқ„ ліҙмҳҖкі , '24л…„м—җлҠ” 3,790л§Ң нҶӨмңјлЎң м „л…„ лҢҖ비 м•Ҫ 4.5% м •лҸ„ мҰқк°Җн•ҳмҳҖлӢӨ1).1)лҢҖмҷёкІҪм ңм •мұ…м—°кө¬мӣҗ, көӯм ңл¶Ғк·№нҸ¬лҹј к°ңмөңмҷҖ лҹ¬мӢңм•„мқҳ л¶Ғк·№ к°ңл°ң л°©н–Ҙ, 2025, Vol. 8(17)
В
В В л¶Ғк·№н•ӯлЎңмқҳ к°ҖмһҘ нҒ° мһҘм җмқҖ кұ°лҰ¬к°Җ 짧лӢӨлҠ” кІғмқҙлӢӨ. нҠ№нһҲ л¶Ғк·№н•ӯлЎңлҠ” мҲҳм—җмҰҲ мҡҙн•ҳ ліҙлӢӨ мҡҙн•ӯ кұ°лҰ¬к°Җ 짧мқҖ нҠ№м§•мқ„ к°Җм§Җкі мһҲлҠ”лҚ°, л¶ҖмӮ°-лЎңн…ҢлҘҙлӢҙ кё°мӨҖмңјлЎң мҲҳм—җмҰҲ мҡҙн•ҳ нҶөкіј мӢң мҡҙн•ӯ кұ°лҰ¬лҠ” лҢҖлһө 22,000km м •лҸ„мқҙм§Җл§Ң, л¶Ғк·№н•ӯлЎң нҶөкіј мӢң 15,000km м •лҸ„лЎң 7,000km м •лҸ„ кұ°лҰ¬к°Җ лӢЁм¶•лҗңлӢӨ. лҳҗн•ң, мҡҙн•ӯ кё°к°„лҸ„ мөңлҢҖ 15мқј м •лҸ„ мӨ„м–ҙл“Өкё° л•Ңл¬ём—җ л¶Ғк·№н•ӯлЎң мқҙмҡ© мӢң кІҪм ңм Ғ нҡЁмңЁм„ұмқҙ лҶ’м•„м§Ҳ мҲҳ мһҲм–ҙ мғҲлЎңмҡҙ лҢҖмІҙн•ӯлЎңлЎң л¶ҖмғҒн•ҳкі мһҲлӢӨ. мқҙм—җ, н•ҙмҡҙм„ мӮ¬лҠ” л¶Ғк·№н•ӯлЎңмқҳ мӢӨнҳ„ к°ҖлҠҘм„ұмқ„ кІҖнҶ н•ҳкі мӮ¬м—… нғҖлӢ№м„ұмқ„ 분м„қн•ҳлҠ” л“ұ нҷңл°ңн•ң мӣҖм§Ғмһ„мқ„ ліҙмқҙкі мһҲлҠ” мғҒнҷ©мқҙлӢӨ.В
В В мқҙмҷҖ н•Ёк»ҳ мөңк·ј лҜё(зҫҺ) м •л¶Җк°Җ лҢҖлҹ¬ кІҪм ңм ңмһ¬мқҳ мҷ„нҷ”л°©м•Ҳмқ„ кІҖнҶ мӨ‘мқҙкі , көӯм ңм •м„ёк°Җ кёүліҖн•ҳлҠ” кІҪмҡ° л¶Ғк·№н•ӯлЎңлҠ” 'м°Ём„ёлҢҖ н•ҙмғҒл¬јлҘҳмқҳ мӨ‘мӢ¬м§Җ'к°Җ лҗ к°ҖлҠҘм„ұмқҙ лҶ’м•„ лҜёлһҳ л¶Ғк·№ н•ҙмғҒмҡҙмҶЎ нҷңм„ұнҷ”м—җ лҢҖ비н•ң мӨҖ비к°Җ н•„мҡ”н•ң мӢңм җмқҙлӢӨ.

2012л…„л¶Җн„° 2024л…„к№Ңм§Җ л¶Ғк·№н•ӯлЎңмқҳ л¬јлҸҷлҹү ліҖнҷ”
в“’https://gcaptain.com/russia-sets-new-arctic-shipping-record-transports-38mt-in-2024-via-northern-sea-route/
В
В
В
В
м•Ҳм „н•ҳкі , м§ҖмҶҚ к°ҖлҠҘн•ҳл©°, м№ңнҷҳкІҪм Ғмқё мқҙмҡ©мқ„ мң„н•ң м „лһө л§Ҳл Ёмқҙ н•„мҡ”
В В мғҲлЎңмҡҙ лҜёлһҳ л¶Ғк·№мҡҙмҶЎнҡҢлһ‘ м„ м җмқ„ мң„н•ң к°•лҢҖкөӯ к°„мқҳ кё°мҲ нҢЁк¶Ң кІҪмҹҒмқҙ мӢ¬нҷ”н•ҳкі мһҲлӢӨ. лҜёкөӯмқҖ нҠёлҹјн”„ ж–°н–үм •л¶Җ м¶ңлІ”м—җ л”°лқј л¶Ғк·№ м—җл„Ҳм§Җ мһҗмӣҗк°ңл°ң кі„нҡҚ мҲҳлҰҪ л°Ҹ к·№м§Җ кіјн•ҷм—°кө¬ нҷ•лҢҖ, н•ӯлЎң к°ңмІҷ л“ұ м „л°©мң„ нҳ‘л Ҙмқ„ мң„н•ҳм—¬ мәҗлӮҳлӢӨ, н•ҖлһҖл“ңмҷҖ л¶Ғк·№ мҮ„л№ҷм„ к°ңл°ң н”„лЎңм қнҠёмқё ICE(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) PACT нҢҢнҠёл„ҲмӢӯ кі„м•Ҫмқ„ мІҙкІ°н•ҳкі , мқҙлҘј нҶөн•ҙ л¶Ғк·№к¶Ң 진м¶ңкіј нҷңлҸҷмқ„ к°•нҷ”н•ҙ лӮҳк°Җкі мһҲлӢӨ.В
В В лҳҗн•ң, мӨ‘көӯмқҖ л¶Ғк·№мқҳ мһҗмӣҗ к°ңл°ңкіј н•ӯлЎң к°ңмІҷмқ„ мң„н•ң к¶ҢлҰ¬лҘј мЈјмһҘн•ҳкі л¶Ғк·№ л¬ём ңмқҳ мқҙн•ҙ лӢ№мӮ¬көӯмңјлЎң м°ём—¬н•ҳкё° мң„н•ҳм—¬ 'мқјлҢҖмқјлЎң(дёҖеё¶дёҖи·Ҝ:мңЎмғҒВ·н•ҙмғҒ мӢӨнҒ¬лЎңл“ң)' м „лһөмқ„ мҲҳлҰҪн•ЁмңјлЎңмҚЁ, лҸҷ мқҙлӢҲм…”нӢ°лёҢлҘј л°”нғ•мңјлЎң лҜёкөӯкіј л¶Ғк·№к¶Ң мҹҒнғҲ кІҪмҹҒмқ„ к°ҖмҶҚнҷ”н•ҳкі мһҲлӢӨ.В
В В н•ңнҺё, лҹ¬мӢңм•„лҠ” мҡ°нҒ¬лқјмқҙлӮҳ мӮ¬нғңлЎң м„ңл°©мқҳ лҢҖлҹ¬ м ңмһ¬лҘј л°ӣлҠ” кіјм •м—җм„ңлҸ„ мӨ‘көӯкіј м „лһөм Ғ лҸҷ맹 кҙҖкі„лҘј лҚ”мҡұ кіөкі нһҲ н•ҳл©°, л¶Ғк·№н•ӯлЎң к°ңмІҷ л°Ҹ мІңм—°к°ҖмҠӨ к°ңл°ңмқ„ мң„н•ң кІҪм ңнҳ‘л Ҙмқ„ 추진н•ҳкі мһҲкі гҖҢ2035л…„к№Ңм§Җ л¶Ғк·№н•ӯлЎң к°ңл°ң кі„нҡҚгҖҚмқ„ к·јк°„мңјлЎң мЈјмҡ” н•ӯл§Ңкіј н„°лҜёл„җ мқён”„лқј к°ңл°ң л°Ҹ көҗнҶөл§қ нҳ„лҢҖнҷ”м—җ м Ғк·№м Ғмқё нҲ¬мһҗлҘј 진н–үн•ҳкі мһҲлӢӨ. мқҙмІҳлҹј көӯк°Җлі„ м„ м җ кІҪмҹҒмқҖ м җм°Ё м№ҳм—ҙн•ҙм§Җкі мһҲм–ҙ л¶Ғк·№н•ӯлЎң нҷңм„ұнҷ”м—җ лҢҖ비н•ң н•өмӢ¬кё°мҲ нҷ•ліҙмҷҖ м „лһөм Ғ лҢҖмқ‘мқҙ ліҙлӢӨ мӨ‘мҡ”н•ҙм§Җкі мһҲлӢӨ.В
В В нҳ„мһ¬ л¶Ғк·№н•ӯлЎңлҘј мҡҙн•ӯн•ҳкі мһҲлҠ” м„ л°•мқҖ лҢҖл¶Җ분 лӮҙл№ҷм„ л°•(ice-strengthened vessel)мңјлЎң кө¬м„ұлҗҳм–ҙ мһҲлӢӨ. м—¬кё°м„ң лӮҙл№ҷм„ л°•мқҖ мқјл°ҳм„ л°•ліҙлӢӨлҠ” нҠјнҠјн•ҳкІҢ л§Ңл“Өкё° мң„н•ҙ кө¬мЎ°м Ғмқё ліҙк°•мқҙ мқҙлЈЁм–ҙ진 м„ л°•мқ„ мқјм»«лҠ”лҚ°, мҠӨмҠӨлЎң м–јмқҢмқ„ к№Ём§Җ лӘ»н•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л¶Ғк·№н•ӯлЎңм—җм„ңлҠ” нҳёмҶЎ мҮ„л№ҷм„ (icebreaker escort)мқҙ м•һм—җм„ң л№ҷнҢҗмқ„ мҮ„л№ҷ(icebreaking)н•ң мқҙнӣ„ 깨진 мң л№ҷ мұ„л„җм—җм„ң мҡҙн•ӯмқ„ к°ҖлҠҘн•ҳкІҢ н•ң лҸ…мһҗм Ғмқё мҮ„л№ҷ кё°лҠҘмқҙ м—ҶлҠ” м„ л°•мқҙлӢӨ. мқҙ кІҪмҡ° мҮ„л№ҷм„ мӮ¬мҡ©лЈҢлҘј лі„лҸ„лЎң м§Җкёүн•ҙм•ј н•ҳлҜҖлЎң л¶Ғк·№н•ӯлЎңлҘј мқҙмҡ©н•ҳлҠ” м„ мӮ¬м—җкІҢ л¶ҖлӢҙмңјлЎң мһ‘мҡ©н•ҳкі мһҲлӢӨ.В

л¶Ғк·№н•ӯлЎңм—җм„ң м—¬лҰ„мІ лӮҙл№ҷм„ л°•мқҳ мҡҙн•ӯ лӘЁмҠөВ
в“’https://pame.is/ourwork/arctic-shipping/
В
В
В В л”°лқјм„ң, л¶Ғк·№н•ӯлЎң мқҙмҡ© мӢң кІҪм ңм„ұмқ„ нҷ•ліҙн•ҳкё° мң„н•ҙм„ңлҠ” мқјл…„ лӮҙлӮҙ мҡҙн•ӯ(year-round operation)мқҙ к°ҖлҠҘн•ҙм•ј н•ҳкі , мқҙлҘј мң„н•ҙ лҸ…мһҗм ҒмңјлЎң мҮ„л№ҷмқҙ к°ҖлҠҘн•ң м„ л°• к°ңл°ңмқҙ н•„мҡ”н•ҳлӢӨ. лӢӨл§Ң, мқҙлҹ¬н•ң м„ л°•мқҳ кІҪмҡ° кұҙмЎ° лӮңмқҙлҸ„к°Җ лҶ’кі кі лҸ„мқҳ м„Өкі„ м „л¬ём„ұмқҙ мҡ”кө¬лҗҳкі мһҲмңјл©°, м„ к°Җ лҳҗн•ң мқјл°ҳм„ л°•ліҙлӢӨ 1.5л°° м •лҸ„ лҶ’м•„ кі л¶Җк°Җк°Җм№ҳ м„ л°•мңјлЎң 분лҘҳлҗ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лҜёлһҳ мЎ°м„ мӮ°м—…мқҳ кІҪмҹҒл Ҙ нҷ•ліҙ мёЎл©ҙм—җм„ң кҙҖл Ё м„Өкі„кё°мҲ мқҳ мЈјк¶Ң нҷ•ліҙк°Җ л¬ҙм—ҮліҙлӢӨ мӨ‘мҡ”н•ҳлӢӨ.В
В
В
В

л¶Ғк·№нғҗмӮ¬ мӨ‘мқё көӯлӮҙ мІ« мҮ„л№ҷм—°кө¬м„ м•„лқјмҳЁнҳё
в“’л¶ҖмӮ°мқјліҙ. 2013.10.04
В
В
В
В В лҳҗн•ң л¶Ғк·№н•ӯлЎңмқҳ л№ҷмғҒнҷҳкІҪмқ„ кі л Өн•ҳм—¬ м•Ҳм „н•ҳкі , нҡЁмңЁм Ғмқё мҡҙн•ӯмқ„ мң„н•ң н•ӯлЎң мөңм Ғнҷ”(route optimization) кё°мҲ лҸ„ н•„мҡ”н•ҳкі , л¶Ғк·№мқҳ к·№мӢ¬н•ң м ҖмҳЁ нҷҳкІҪм—җм„ңлҸ„ к°Ғмў… кё°мһҗмһ¬к°Җ мӣҗнҷңн•ҳкІҢ мһ‘лҸҷлҗ мҲҳ мһҲлҠ” л°©н•ңм„Өкі„(winterization) кё°мҲ кіј мҳҲкё°м№ҳ лӘ»н•ң мӮ¬кі м—җ мӢ мҶҚн•ҳкІҢ лҢҖмқ‘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Ӯ¬кі лҢҖмқ‘ м Ҳм°Ё л§Ҳл Ё л°Ҹ көӯм ңкё°кө¬м—җм„ң кҙҖл Ё м§Җм№Ё к°ңл°ңлҸ„ н•„мҡ”н•ҳлӢӨ. л”°лқјм„ң, мқҙлҹ¬н•ң кё°мҲ л“ұмқҙ нҷ•ліҙлҗҳкі м¶©л¶„н•ң кІҖмҰқмқҙ мқҙлЈЁм–ҙ진лӢӨл©ҙ л¶Ғк·№н•ӯлЎң нҷңм„ұнҷ” мӢң м„ л°•мқҳ м•Ҳм „н•ҳкі , м§ҖмҶҚ к°ҖлҠҘн•ҳл©°, м№ңнҷҳкІҪм Ғмқё мқҙмҡ©мқҙ к°ҖлҠҘн• кІғмңјлЎң нҢҗлӢЁлҗңлӢӨ.

л¶Ғк·№мқҙмӮ¬нҡҢ мӮ°н•ҳ л¶Ғк·№н•ҙм–‘нҷҳкІҪліҙнҳё мһ‘м—…л°ҳ нҷҲнҺҳмқҙм§Җ лӘЁмҠө
в“’https://pame
В
В
В
В
В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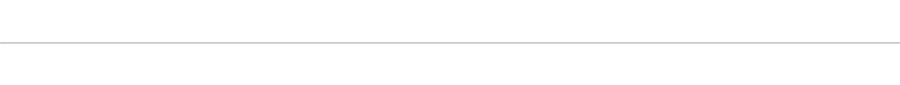

В
м •м„ұм—Ҫ
В
м„ л°•н•ҙм–‘н”ҢлһңнҠём—°кө¬мҶҢ м§ҖлҠҘнҳ•м„ л°•м—°кө¬ліёл¶Җ
кіөн•ҷл°•мӮ¬
В
м„ л°• л№ҷм„ұлҠҘ, л¶Ғк·№н•ӯлЎң, к·№м§Җмҡҙн•ӯ м•Ҳм „кё°мӨҖ,В Ship Performance in Ice, Northern Sea Route, Polar Code
 В
В